- “최소 15곳 take over” 트럼프가 직접 꺼낸 단어들
- 주 권한이 기본인 미국 선거, ‘국가화’는 왜 부딪히나
- 중간선거로 갈수록 커질 ‘룰 전쟁’과 부정선거 프레임

트럼프, 다시 “부정선거” 꺼냈다…“연방이 선거 ‘국가화’해야” 발언에 미국 정가 들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다시 전면에 올렸다. 최근 보수 성향 진행자 댄 봉지노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15곳에서 투표를 가져와야 (take over)하고, 투표를 국가화(nationalize)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미국 선거가 원칙적으로 주(州)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연방정부가 선거를 사실상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최소 15곳…take over, nationalize” 트럼프가 직접 꺼낸 단어들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강도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최소 15곳”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공화당이 투표를 ‘가져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로이터는 이를 “선거를 연방이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고, ABC도 같은 맥락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절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가 왜 선거를 안 하나” 발언까지…정치권 반발 확산
트럼프의 발언은 ‘인터뷰 발언’에서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부가 선거에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이에 반발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존 튠은 “선거의 연방화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미국 선거는 ‘주 권한’이 기본…“국가화”는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미국 선거는 주 정부·지방정부가 등록, 투표 방식, 개표 등 실무를 맡는 구조가 뼈대다. 연방 차원에서 선거 관련 법이 존재하더라도, 선거를 통째로 ‘국가화’하는 방식은 헌법·법률·정치 지형에서 높은 장벽이 있다는 해설이 잇따랐다.
CBS는 “트럼프가 ‘nationalize’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제도적 쟁점을 정리했다.

왜 지금 다시 ‘부정선거’인가…정치적 ‘의제 전환’ 카드
이번 발언은 정치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첫째, 부정선거 담론은 지지층 결집에 강력한 도구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도 2020년 선거에 대한 허위·과장 주장을 반복해왔고, 보수 진영의 ‘투표 규정 강화’ 요구와 맞물려 이슈가 재점화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둘째, ‘연방 개입’은 단순 논평이 아니라 제도 전쟁의 신호탄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문제제기가 시민권(국적) 증명 등을 요구하는 법안 논의와 연결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전면적 ‘연방 통제’가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투표 요건 강화·감사 확대·연방 지원금과의 연계” 같은 방식으로 선거 규칙을 둘러싼 공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풀턴 카운티 선거사무소 FBI 수색도 불씨…“흥미로운 게 나올 것” 발언
논란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이슈와도 맞물렸다. CBS는 최근 FBI가 풀턴 카운티 선거 관련 사무소를 수색해 2020년 대선 관련 자료(투표지 등)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전하면서, 트럼프가 이 사안을 언급하며 “흥미로운 일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색 자체는 ‘부정선거의 증명’과는 별개인데도, 정치적 언어가 덧씌워지면서 논쟁의 온도는 더 올라갔다.
‘연방 통제’는 벽이 높다, 하지만 “부정선거 프레임”은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거를 ‘국가화’하는 것은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다만 이번 발언이 남긴 파장은 작지 않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선거제도와 유권자 요건을 둘러싼 법안·소송·정치 공방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쉬운 구호로 반복 호출될 수 있다.
- 관련기사
-
- TAG
-
 트럼프, 다시 “부정선거” 꺼냈다…“연방이 선거 ‘국가화’해야” 발언에 미국 정가 들썩
트럼프가 보수 성향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15곳에서 투표를 take over하고 nationalize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부정선거’ 논쟁을 재점화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지만, 미국 선거는 주 권한이 기본이라 ‘국가화’는 제도적 장벽이 크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공화당 지도부도 선을 그었다. 풀턴 카운티 선거 관련 FBI 수색 이슈까지 겹치며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 룰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다시 “부정선거” 꺼냈다…“연방이 선거 ‘국가화’해야” 발언에 미국 정가 들썩
트럼프가 보수 성향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15곳에서 투표를 take over하고 nationalize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부정선거’ 논쟁을 재점화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지만, 미국 선거는 주 권한이 기본이라 ‘국가화’는 제도적 장벽이 크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공화당 지도부도 선을 그었다. 풀턴 카운티 선거 관련 FBI 수색 이슈까지 겹치며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 룰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설 선물 TOP10 ① 왜 한우가 매년 ‘정답’이 될까
설 명절 선물의 ‘TOP1’로 한우 선물세트가 꾸준히 선택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격식 있는 품목이라 양가 어른·상사·거래처에 체면을 세워주고, 동시에 구이·불고기·국거리 등 활용 폭이 넓어 실속도 높다. 마블링과 부위 구성이 눈에 보여 체감 가치가 크며, 개별 진공 포장과 쇼핑백까지 갖추면 ‘정성’이 더해진다. 5만~20만 원대까지 예산 설계가 쉽고, 냉장·냉동 선택, 중량(3~4인 800~900g), 설 전 배송일·보관 안내만 점검하면 명절 물류 변수에도 만족도를 지킬 수 있다. 짧은 감사 메시지 한 줄이면 선물의 완성도가 올라간다.
설 선물 TOP10 ① 왜 한우가 매년 ‘정답’이 될까
설 명절 선물의 ‘TOP1’로 한우 선물세트가 꾸준히 선택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격식 있는 품목이라 양가 어른·상사·거래처에 체면을 세워주고, 동시에 구이·불고기·국거리 등 활용 폭이 넓어 실속도 높다. 마블링과 부위 구성이 눈에 보여 체감 가치가 크며, 개별 진공 포장과 쇼핑백까지 갖추면 ‘정성’이 더해진다. 5만~20만 원대까지 예산 설계가 쉽고, 냉장·냉동 선택, 중량(3~4인 800~900g), 설 전 배송일·보관 안내만 점검하면 명절 물류 변수에도 만족도를 지킬 수 있다. 짧은 감사 메시지 한 줄이면 선물의 완성도가 올라간다.
 트럼프 ‘독립기념 아치, 더 크게 더 크게!! 76m…미국 250주년 상징물 논쟁
미국 독립 250주년(2026년 7월 4일)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독립기념 아치(Independence Arch)’를 세우자는 구상이 논쟁을 키우고 있다.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Trump)가 “250 for 250” 논리로 250피트 개선문(triumphal arch) 구상을 선호하며 규모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모리얼 서클(Memorial Circle) 부지와 추모축 경관 훼손 우려가 핵심 쟁점이며, 국립공원관리청(NPS) 등 승인 절차가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트럼프 ‘독립기념 아치, 더 크게 더 크게!! 76m…미국 250주년 상징물 논쟁
미국 독립 250주년(2026년 7월 4일)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독립기념 아치(Independence Arch)’를 세우자는 구상이 논쟁을 키우고 있다.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Trump)가 “250 for 250” 논리로 250피트 개선문(triumphal arch) 구상을 선호하며 규모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모리얼 서클(Memorial Circle) 부지와 추모축 경관 훼손 우려가 핵심 쟁점이며, 국립공원관리청(NPS) 등 승인 절차가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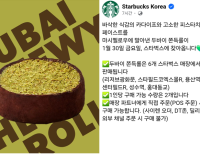 From Neighborhood Bakeries to Starbucks: Korea’s “Dubai Chewy Cookie” Craze Is Now a Full-Blown Line Culture
Starbucks Korea just confirmed what every trend-watcher in Seoul already felt in their bones: the “Dubai chewy cookie”—nicknamed Doojjonku (short for Dubai Chewy Cookie)—has officially graduated from local bakery flex to big-brand takeover. Starting January 30, Starbucks will sell a “Dubai Chewy Roll” in only six stores, with a strict limit of two per person—the kind of rules that don’t calm hype, b...
From Neighborhood Bakeries to Starbucks: Korea’s “Dubai Chewy Cookie” Craze Is Now a Full-Blown Line Culture
Starbucks Korea just confirmed what every trend-watcher in Seoul already felt in their bones: the “Dubai chewy cookie”—nicknamed Doojjonku (short for Dubai Chewy Cookie)—has officially graduated from local bakery flex to big-brand takeover. Starting January 30, Starbucks will sell a “Dubai Chewy Roll” in only six stores, with a strict limit of two per person—the kind of rules that don’t calm hyp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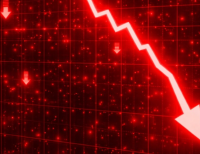 ‘비트코인 심상치 않다’ 7만3천달러 깨졌다.. 15개월만에 최저! 빅 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경고
‘비트코인 심상치 않다’ 7만3천달러 깨졌다.. 15개월만에 최저! 빅 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경고
 잘했다 로제, 그래미 ‘메인 타이틀’에 이름 새겼다…오늘 한국·한국계 성적표 총정리
잘했다 로제, 그래미 ‘메인 타이틀’에 이름 새겼다…오늘 한국·한국계 성적표 총정리
 [속보] 스페이스X, xAI 인수로 ‘우주 AI’ 선언… 상장시 최대 2,100조원까지 가능성! 일론 머스크의 승부수
[속보] 스페이스X, xAI 인수로 ‘우주 AI’ 선언… 상장시 최대 2,100조원까지 가능성! 일론 머스크의 승부수
 ‘쉬는 60대’는 옛말…70.5%가 말한 은퇴의 변화
‘쉬는 60대’는 옛말…70.5%가 말한 은퇴의 변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날뛰는지 알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11월을 보라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날뛰는지 알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11월을 보라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