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가면 5만, 가면 10만”… 여전히 유효할까?
- 강남 3,509만 원 vs 지방 1,181만 원, 하객 부담도 다르다
- “5만 원 봉투는 밥값도 안 돼요” 하객들의 현실 고민

“축의금 얼마가 맞을까”…‘식대 6만 원 시대’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린다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 봉투를 한 번 더 만지작거리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결혼식에 드는 ‘밥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최신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은 2,160만 원.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가 오름세를 주도했고, 1인당 식대 중간값은 처음으로 6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은 8만 8천 원까지 치솟았다. “5만 원 봉투면 예의”이던 관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배경이다.
강남 3,509만 원 vs. 경상 1,181만 원…지역 격차가 ‘축의금 감’도 바꾼다
결혼비용의 지형도는 지역별로 극명하다. 수도권 평균은 2,665만 원, 비수도권은 1,511만 원. 서울 강남은 3,509만 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반대로 경상권은 1,181만 원으로 최저였다. 부산의 예식장(대관+식대+기본장식) 중간가격은 775만 원으로 특히 낮게 집계됐다. 이런 격차는 하객이 ‘어느 동네, 어떤 예식장에 가느냐’에 따라 최소선으로 느끼는 축의금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실제 식대만 보더라도 지역별 간극은 크다. 강남 8만 8천 원, 강남 외 서울 7만 원대, 경기·광주 6만 2천 원 수준, 제주는 4만 2천 원대가 보도됐다. 같은 ‘하객 1명’이어도 초대 장소에 따라 ‘밥값 기준’이 2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안 가면 5만, 가면 10만”에서 “10만이 기본선”으로
축의금의 ‘사회적 기준선’도 변하고 있다. 2024년 신한은행 보고서에서 “불참 시 5만 원, 참석 시 10만 원”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2025년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는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으로 ‘10만 원’이 다수 의견이 됐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5만 원’이 우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와 결혼비용 상승이 봉투 금액 인식에 반영된 셈이다.
언론 보도에서 “강남 예식에 5만 원은 식대도 못 미친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식대가 전국 평균 6만 원 선으로 올라선 만큼, 참석 기준의 하한선이 10만 원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관찰이다.
그래서 ‘요즘’ 얼마가 적당한가
관계의 두께, 동반 여부, 본인의 형편과 더불어 식대·대관료 수준을 함께 보는 게 현실적이다. 최근 수치를 빌려, 하객들이 체감하는 ‘무난한 가이드’를 정리하면 이렇다.
강남·고급 호텔 예식(식대 8만 8천 원 안팎): 최소 10만 원, 친한 사이라면 15만~20만 원도 자연스러움. 식사 동반 시 +5만 원 내외 추가 고려.
서울(강남 외)·수도권 중상급 예식(식대 6만 후반~7만 원대): 10만 원이 보편적 하한. 친분도·좌석 형태에 따라 10만~15만 원 범위.
광역시·중간권 예식(식대 6만 원대 초반): 7만~10만 원 사이가 무난. 동반 여부·관계에 따라 상하 조정.
지방 중소도시·소규모 예식(식대 4만~5만 원대): 5만~7만 원이 여전히 많은 편. 다만 참석해 식사한다면 5만 원 ‘단일 금액’은 요즘 감각에선 아슬아슬할 수 있다.
핵심은 “식사+자리 마련 비용을 최소한 존중하는가”다. 결혼비용 상승의 결정적 항목이 식대·대관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 시 10만 원, 불참 시 5만 원의 오래된 공식은 ‘장소·급’에 따라 더 이상 보편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

왜 이렇게 올랐나
소비자원은 식재료·생화 장식·인건비 상승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8월 기준 대관료 중간값은 350만 원(두 달 전 300만 원 대비 16.7%↑), 생화 꽃장식도 262만 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는 보합에 가깝지만, 현장 연출비·인건비가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 다른 배경에는 ‘결혼 수요’의 회복도 있다. KB국민카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결혼식 한 달 전 카드 사용액 지수가 1년 전 대비 약 20% 늘었다. 수요가 되살아난 시장에서 가격이 경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실적인 결론: ‘정답’ 대신 ‘근거 있는 선택’
축의금에는 법도, 국룰도 없다. 다만 최근 수치는 분명한 힌트를 준다.
첫째, 참석 시 10만 원이 하한선처럼 작동하고 있다. 둘째, 장소·급에 따라 더해지는 프리미엄이 커졌다(강남·호텔 예식). 셋째, 불참 봉투 5만 원은 여전히 보편적이나, 가까운 사이라면 7만~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도 보인다.
결국 축의금은 관계의 밀도(친분·직접성) + 참석 여부 + 식대 수준 + 자신의 형편의 함수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떤 예식장에, 어떤 자리로 불렸는지에 따라 ‘무난’과 ‘부족’의 경계가 달라진다.
 South Korea Emerges as the Top English-Proficient Country Among Non-English-Speaking Nations in Asia
South Korea’s English proficiency has been confirmed to be the highest among non-English-speaking countries in Asia. According to th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PI) 2025, the world’s largest English proficiency assessment, South Korea ranked 48th globally and first among Asian countries that do not use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 Global Rank: 48th — No.1 in Non-English-Speaking AsiaIn the latest EF EPI assessment, ...
South Korea Emerges as the Top English-Proficient Country Among Non-English-Speaking Nations in Asia
South Korea’s English proficiency has been confirmed to be the highest among non-English-speaking countries in Asia. According to th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PI) 2025, the world’s largest English proficiency assessment, South Korea ranked 48th globally and first among Asian countries that do not use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 Global Rank: 48th — No.1 in Non-English-Speaking AsiaIn the latest EF EPI assessment, ...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걱정 없다 …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예타 통과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걱정 없다 …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예타 통과
 “탈세 아니다”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 과세 취소, 수억대 세금 돌려받는다
“탈세 아니다”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 과세 취소, 수억대 세금 돌려받는다
 빵빵여행 5- 🥜 다음 빵 트렌드는 피넛버터? … 성신여대의 숨은 보석, '어썸피넛'
빵빵여행 5- 🥜 다음 빵 트렌드는 피넛버터? … 성신여대의 숨은 보석, '어썸피넛'
 굿바이, 우리의 영원한 꽃할배 이순재
굿바이, 우리의 영원한 꽃할배 이순재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OST 깜짝 공개.. 나혼렙 온 아이스 리스닝 파티 현장 스케치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OST 깜짝 공개.. 나혼렙 온 아이스 리스닝 파티 현장 스케치
 누리호, 새벽 1시 13분 하늘을 찢다… 센서 이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첫 야간 발사 성공
누리호, 새벽 1시 13분 하늘을 찢다… 센서 이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첫 야간 발사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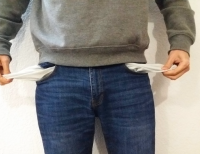 40대, 소득 피크라는데… 40대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 - 4060 소득 리얼체크 시리즈 ①
40대, 소득 피크라는데… 40대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 - 4060 소득 리얼체크 시리즈 ①
 《천수연의 AI시대 한국문화 읽기》김치와 김장,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한국의 맛과 문화
《천수연의 AI시대 한국문화 읽기》김치와 김장,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한국의 맛과 문화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