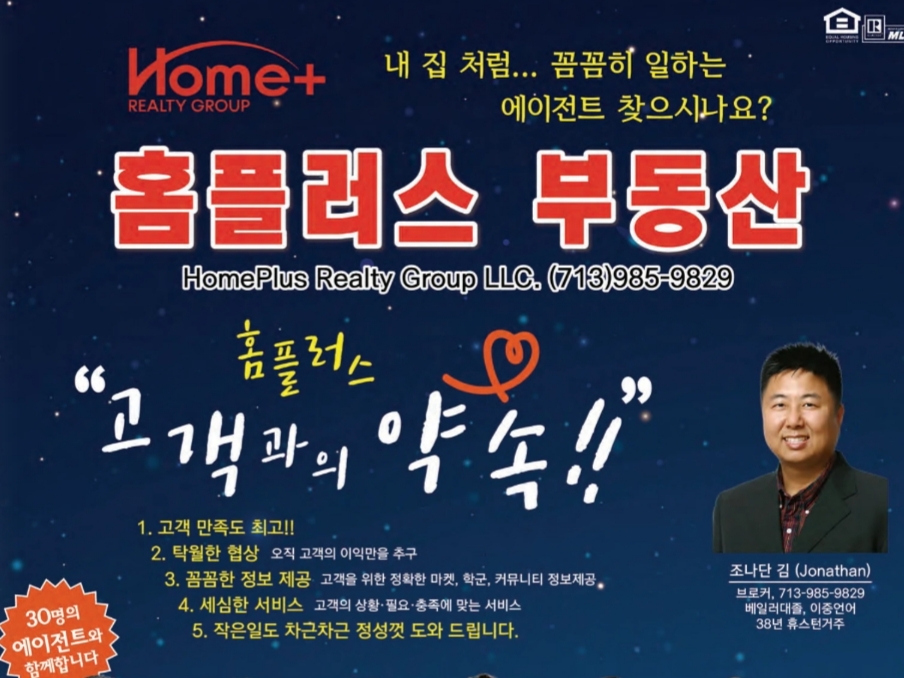- 트럼프, 동맹국 상대로 ‘보호비’ 요구… 왜 탄핵은 불가능한가
- 셧다운·투자 협박·가족 비즈니스… 트럼프의 권력 사유화
- 국제사회는 비난, 지지층은 환호… 트럼프의 모순된 정치학

트럼프, 국제적 깡패 행보에도 탄핵은 왜 불가능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다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동맹국을 상대로 ‘보호비’를 요구하듯 방위비와 투자 부담을 강요하고, 무역 협상을 협박의 장으로 바꾸며 사실상 깡패식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셧다운 위기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들먹이며 협박을 가하고, 대통령 권한을 가족의 재산 증식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건재하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탄핵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헌법 구조상 높은 장벽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 탄핵 요건을 극도로 높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책임 추궁 절차가 아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유죄를 선고해야만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의회 구도다. 공화당이 상원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논란을 일으켜도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는 한 탄핵은 성립할 수 없다. 제도적 장치 자체가 대통령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합의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화당의 ‘볼모 정치’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행보가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 정치의 현실이다.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순간, 해당 정치인은 곧바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당의 선거 승리를 좌우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의 지지층은 충성도가 높고, 이들의 결집 없이는 공화당 전체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과격한 언행을 알고도 눈감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국회의사딩 = 픽사베이
미국국회의사딩 = 픽사베이
유권자들의 면죄부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의 행태가 깡패짓으로 비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지지층은 트럼프를 ‘협상가’로 보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내는 모습은 “강한 미국을 위한 좋은 거래”로 포장된다. 셧다운을 무기로 삼아 공무원을 압박하는 방식도 “비효율적인 워싱턴을 개혁하는 단호한 리더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권한을 가족의 사업이나 재산에 활용한다는 비판 역시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특유의 방식”이라는 식으로 정당화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비난받는 행동이, 국내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견제 장치의 무력화
대통령 권력 남용을 제어해야 할 의회와 사법부의 역할도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과 견제 시도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다. 이러한 서사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으며, 제도적 견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미국의 견제 장치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트럼프는 정치적 타격 대신 오히려 ‘피해자’ 이미지를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
탄핵 불가능의 정치학
이 모든 요인이 맞물려, 트럼프는 국제적으로는 깡패짓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권력 사유화 논란을 일으켜도 실질적인 탄핵 위기에 몰리지 않는다. 헌법은 높은 장벽을 쳐 놓았고, 공화당은 당파적 이해 때문에 그를 버리지 못하며, 유권자 일부는 트럼프의 행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탄핵은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구조적 문제
트럼프의 국제적·국내적 행태는 미국을 ‘세계 경찰’에서 ‘세계 깡패’로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헌정 구조와 정당 정치, 그리고 유권자 심리라는 3중 구조가 그를 지탱하고 있는 한, 탄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부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당,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낸 합작품에 가깝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트럼프식 정치의 재현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 한국은 2계절만 남은 건가?... 이번 주 비 끝나면 ‘겨울 한기’ 온다는 데 이유는?
이번 주 전국에 비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20일 아침 최저 7도, 낮 15도로 쌀쌀해지고, 중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이 현상은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과 북서풍 유입에 따른 전형적인 가을→겨울 전환기 패턴이다.기상청은 일교차가 커지고 체감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건강·농작물 피해 예방 등 대비를 당부했다.이번 비가 사실상 ‘가을의 끝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은 2계절만 남은 건가?... 이번 주 비 끝나면 ‘겨울 한기’ 온다는 데 이유는?
이번 주 전국에 비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20일 아침 최저 7도, 낮 15도로 쌀쌀해지고, 중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이 현상은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과 북서풍 유입에 따른 전형적인 가을→겨울 전환기 패턴이다.기상청은 일교차가 커지고 체감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건강·농작물 피해 예방 등 대비를 당부했다.이번 비가 사실상 ‘가을의 끝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계를 부순 K-POP 아이돌... 탈북자와 청각장애 아티스트가 만든 새로운 무대, 1VERSE와 Big Ocean
K-팝이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북한 출신 멤버를 포함한 다국적 그룹 1VERSE와 청각장애 아티스트로 구성된 Big Ocean이 등장하며, 음악 산업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VERSE는 “국경을 넘는 청년의 서사”를, Big Ocean은 “소리를 느끼는 음악”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경계를 허물고 있다. 진동과 수어로 리듬을 표현하고, 탈북과 장애라는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들의 무대는 K-팝이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언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경계를 부순 K-POP 아이돌... 탈북자와 청각장애 아티스트가 만든 새로운 무대, 1VERSE와 Big Ocean
K-팝이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북한 출신 멤버를 포함한 다국적 그룹 1VERSE와 청각장애 아티스트로 구성된 Big Ocean이 등장하며, 음악 산업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VERSE는 “국경을 넘는 청년의 서사”를, Big Ocean은 “소리를 느끼는 음악”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경계를 허물고 있다. 진동과 수어로 리듬을 표현하고, 탈북과 장애라는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들의 무대는 K-팝이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언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와 Gemini(제미나이) 등 주요 AI 도구 활용률에서 격차도 뚜렷했다. 인식·경험 격차 뚜렷, 한국이 전반적 우세 조사 결과, AI 도구를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와 Gemini(제미나이) 등 주요 AI 도구 활용률에서 격차도 뚜렷했다. 인식·경험 격차 뚜렷, 한국이 전반적 우세 조사 결과, AI 도구를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의 끝은 ‘면허 과잉’... 55만 명 중 11만 명만 현장에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55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영업 중인 개업 중개사는 11만 명뿐이다. 면허 보유자 5명 중 1명만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셈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AI 플랫폼 확산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장롱 속 면허’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노후 대비용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생계형 수단이 아닌 ‘보류된 희망’이 되었다. 업계는 단순 중개에서 벗어나 세무·데이터 컨설팅 등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면허의 실질 가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의 끝은 ‘면허 과잉’... 55만 명 중 11만 명만 현장에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55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영업 중인 개업 중개사는 11만 명뿐이다. 면허 보유자 5명 중 1명만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셈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AI 플랫폼 확산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장롱 속 면허’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노후 대비용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생계형 수단이 아닌 ‘보류된 희망’이 되었다. 업계는 단순 중개에서 벗어나 세무·데이터 컨설팅 등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면허의 실질 가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헬스·필라테스 폐업 ‘먹튀’ 피해 1,000건 육박… 선불금 2억 원 증발
헬스·필라테스 폐업 ‘먹튀’ 피해 1,000건 육박… 선불금 2억 원 증발
 은마아파트,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착공·20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착공·2034년 준공 목표
 헐리우드 스타들도 다시 찾는 Y2K 잇백 … 2000년대 빈티지 백이 돌아왔다
헐리우드 스타들도 다시 찾는 Y2K 잇백 … 2000년대 빈티지 백이 돌아왔다
 《천수연의 AI시대 한국문화 읽기》창덕궁의 후원, 600년의 시간을 초월한 AI 시대의 감성
《천수연의 AI시대 한국문화 읽기》창덕궁의 후원, 600년의 시간을 초월한 AI 시대의 감성

 목록
목록